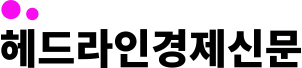한국은 더 이상 단일 민족 국가라는 오래된 자기 이미지를 붙잡고 있을 수 없는 사회가 되었다. 공식 통계에 따르면 외국인 주민은 이미 전체 인구의 약 4.1%에 달한다. 거리에서 마주치는 외국인 노동자, 학교에서 함께 수업을 듣는 다문화 가정의 아이들, 지역 축제에 참여하는 이주민 공동체는 이제 낯설지 않은 풍경이 되었다. 이는 단순한 숫자의 증가가 아니라 한국 사회의 구조적 변화를 보여주는 신호다.

정부는 이주민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교육·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있다. 다문화 가정 아동을 위한 언어 교육, 이주민을 위한 한국어 교실, 문화 교류 프로그램 등은 겉으로 보기에 ‘공존’과 ‘다양성 존중’을 표방한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인구 절벽을 메우려는 계산법이 뿌리 깊게 자리한다. 이주민은 산업 현장의 인력 부족을 메우는 수단으로 다뤄지고, 농촌의 계절 노동, 건설 현장, 돌봄 노동을 담당하며 사회의 필수적 역할을 하고 있다. 하지만 그들의 법적 지위와 권리는 여전히 불안정하고, 목소리는 정책 담론 속에서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다. 결국 다문화 정책은 체류 중 필요한 최소한의 적응을 돕는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이주민을 바라보는 사회적 인식 역시 문제다. 많은 한국인에게 외국인은 여전히 ‘손님’이자 ‘임시 거주자’로 인식된다. 다문화라는 용어 자체가 ‘우리와 다른 사람’을 구분하는 경계의 언어가 되기도 한다. 학교에서는 다문화 가정 아동이 따돌림을 당하고, 직장에서는 언어와 문화의 차이를 이유로 차별을 겪는다. 언론은 이주민 범죄를 과도하게 부각하며 이들을 잠재적 문제 집단으로 낙인찍는 경향이 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이주민은 동등한 구성원이 아니라, 언제든 대체 가능한 인력으로만 취급되기 쉽다.
물론 긍정적인 변화도 있다. 일부 지역에서는 이주민이 지역 경제와 문화에 활력을 불어넣고, 다문화 가정의 청소년들은 언어와 문화의 이중성을 통해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가능성이 제도적으로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사회는 배제와 갈등의 함정에 빠질 위험이 크다. 특히 경제 위기 상황이 닥칠 때 이주민은 손쉬운 희생양으로 지목될 수 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은 분명하다. 이주민을 단순히 인구 절벽을 메우는 도구로 볼 것인가, 아니면 한국 사회의 동등한 시민으로 인정할 것인가. 노동력 중심의 정책은 단기적 경제 효과를 낼 수 있을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사회적 균열을 키울 것이다. 반면 진정한 통합 정책은 교육과 복지, 정치 참여를 아우르며 이주민을 시민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전제로 한다.
세계 다른 나라들은 이미 이 과제에 직면해 다양한 시도를 해왔다. 독일과 캐나다는 이주민을 단순히 인력으로 보지 않고, 장기적 사회 구성원으로 수용하는 방향을 선택했다. 언어 교육, 직업 훈련뿐 아니라 정치적 권리와 사회적 참여를 보장하면서 이주민을 사회의 파트너로 인식했다. 갈등은 존재하지만, 적어도 사회적 정체성을 공유하려는 노력이 제도화되어 있다. 한국 역시 더 이상 노동력 확보라는 단기적 계산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다문화 사회로 가는 길은 분명 쉽지 않다. 그러나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고, 이를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한국의 미래가 달라질 것이다. 언론은 자극적 보도를 벗어나 이주민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어야 하고, 교육은 ‘우리 문화에 적응’이라는 단방향 모델이 아닌 상호 존중의 문화를 가르쳐야 한다. 정책은 노동력 공급을 넘어 권리 보장과 시민 참여를 제도화해야 한다.
공존은 구호가 아니다. 제도와 일상 속에서 구체적으로 실현될 때 의미를 갖는다. 다문화 사회는 이미 도착했다. 이제 남은 선택은 그 사회를 배제와 차별로 물들일 것인지, 아니면 다양성과 존중을 기반으로 새로운 길을 열 것인지다. 한국 사회는 더 이상 준비 중일 수 없다. 지금이 바로 그 길을 결정해야 할 시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