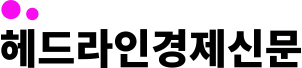7장. 기억의 땅, 망각의 정치
전쟁이 끝난 뒤에도 총성은 사라지지 않는다.
그 총성은 이제 인간의 내면에서 울린다.
총은 녹슬고, 시체는 묻혔지만,
기억은 결코 매장되지 않는다.
기억은 땅속에서 자란다.
그리고 그 뿌리는 언제든 다시 피를 흡수한다.
폴 포트가 사라진 후,
캄보디아는 다시 세워졌다.
사람들은 집을 짓고, 시장을 열고, 학교를 세웠다.
그러나 그 모든 위에는 묘지가 있었다.
아이들이 뛰노는 운동장은 과거의 집단 매장지였고,
사찰의 종소리는 여전히 죽은 자들의 이름을 불렀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묻지 않았다.
왜냐하면 묻는다는 것은 다시 살아 있는 공포를 부르는 일이기 때문이다.
인간은 기억으로 살아가지만,
때로는 망각으로만 버틸 수 있다.
캄보디아의 재건은 돌을 세우는 일이 아니라,
침묵을 정당화하는 일이었다.
사람들은 진실보다 평화를 선택했고,
정의보다 안정을 택했다.
그 침묵은 비겁함이 아니라,
생존의 또 다른 이름이었다.
정부는 화해를 말했다.
그러나 화해는 언제나 정치의 언어였다.
그들은 진실을 밝히기보다,
진실을 관리했다.
법정이 열렸고, 재판이 진행되었지만,
그곳에서 다뤄진 것은 죄의 일부에 불과했다.
역사 전체를 다루기에는
인간의 마음이 너무 피로했다.
세계는 캄보디아를 동정했고,
유엔은 구호금을 보냈다.
그러나 기억은 돈으로 치유되지 않았다.
기억은 국가가 정비할 수 있는 데이터가 아니었다.
기억은 울음의 언어였고,
그 언어는 여전히 입 밖으로 나오지 못했다.
사람들은 다시 불교로 돌아왔다.
사찰은 킬링필드의 옆에 세워졌고,
스님들은 망자의 이름을 읊으며
그들의 고통이 다음 생으로 이어지지 않기를 빌었다.
불교는 이제 신앙이 아니라,
집단적 치료의 의식이 되었다.
“이 생에서는 잊고, 다음 생에서 다시 시작하자.”
그 말은 위로였지만, 동시에 체념이었다.
망각은 독이다.
그러나 어떤 독은 생존을 위해 필요하다.
캄보디아의 사람들은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들은 고통을 잊은 것이 아니라,
고통을 ‘접어둔’ 것이다.
마치 닫힌 상자처럼,
필요할 때만 꺼내 볼 수 있도록.
그 상자는 오늘도 사원의 기둥 밑,
가정의 제단 속에 조용히 놓여 있다.
기억을 다루는 가장 효율적인 방식은,
기억을 국가가 독점하는 것이다.
캄보디아 정부는 과거를 ‘기념일’과 ‘박물관’ 속에 가두었다.
죽음은 전시되고, 비극은 제도화되었다.
그 순간, 기억은 더 이상 살아 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관리 가능한 상품이 되었다.
“역사를 소유한 자가 권력을 가진다.”
이것은 킬링필드 이후의 새로운 법칙이었다.
하지만 진짜 기억은 제도 밖에서 산다.
노파의 눈가 주름,
밤마다 불 켜진 사찰의 향내,
아이에게 들려주는 짧은 이야기 속에서.
그 기억은 기록되지 않지만,
세대를 넘어 전해진다.
그것이 인간이 잊지 않는 방식이다.
문명은 과거를 복원할 수 있지만,
인간은 과거를 다시 살 수는 없다.
캄보디아는 다시 일어섰지만,
그 복원된 문명 속에는 균열이 남았다.
그 균열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그것이 바로 진실의 흔적이다.
망각은 죄가 아니다.
망각은 인간의 진화가 남긴 마지막 방어기제다.
그 덕분에 사람들은 밥을 먹고,
웃고, 아이를 키울 수 있었다.
그러나 그 망각이 완전해질 때,
역사는 다시 같은 실수를 반복한다.
그리고 그때마다 인간은
자신의 과거를 ‘다른 이름으로’ 다시 경험한다.
8장. 오늘의 캄보디아, 내일의 인간
시간은 모든 상처를 덮지 않는다.
그저 상처의 모양을 바꿔 놓을 뿐이다.
킬링필드의 흙 위에 새로운 도시가 세워졌고,
그 위로 광고판과 스마트폰 신호가 떠올랐다.
이제 사람들은 신 대신 기술을 믿는다.
기도 대신 검색을 하고,
사원 대신 쇼핑몰로 향한다.
그러나 신이 사라진 자리에 남은 공허는,
여전히 같은 형태로 존재한다.
오늘의 캄보디아는 젊다.
거리의 오토바이 엔진 소리와
SNS에 떠도는 웃음 속에서
과거의 비명은 들리지 않는다.
젊은 세대는 앙코르를 ‘유적지’로 알고,
킬링필드를 ‘역사’로 배운다.
그들에게 그것은 경험이 아니라,
사진 속의 이야기다.
기억이 살아 있던 세대가 떠난 자리를
이제 데이터가 채운다.
문명은 기억을 기록으로 대체하는 순간,
그 영혼을 잃는다.
디지털의 캄보디아는
더 이상 신을 믿지 않는다.
그 대신 ‘성장률’과 ‘투자지수’를 신처럼 받든다.
GDP는 새로운 경전이 되었고,
개발은 현대의 기도문이 되었다.
그러나 인간은 여전히 같은 질문을 던진다.
“이 모든 것은 무엇을 위한가?”
앙코르의 돌은 여전히 서 있다.
관광객들이 셀카를 찍는 그 순간에도
돌은 아무 말이 없다.
그 돌의 침묵은 천 년 전의 신과,
오늘의 인간을 똑같이 바라본다.
인간은 여전히 무언가를 믿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고,
그 믿음은 언제나 형태만 바꿔 다시 태어난다.
한때는 신이었고,
한때는 이념이었고,
이제는 자본이다.
그러나 진정한 문명은
무엇을 세우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기억하느냐로 결정된다.
기억 없는 발전은
의미 없는 반복일 뿐이다.
킬링필드의 유골은 흙 속에 묻혔지만,
그것이 남긴 질문은 여전히 인간의 뼛속에 남아 있다.
“우리는 얼마나 쉽게 잊는가?”
젊은 세대는 과거를 모른다.
그러나 그들은 또 다른 의미에서
가장 자유로운 세대다.
그들은 신도, 왕도, 이념도 믿지 않는다.
그들은 단지 ‘자신의 삶’을 믿는다.
그것이 문명의 새로운 가능성이다.
과거의 믿음이 인간을 묶었다면,
이 세대의 무신앙은 인간을 풀어준다.
하지만 자유에는 언제나 공허가 따른다.
신을 버린 인간은 이제 자신을 신으로 만들어야 하기 때문이다.
캄보디아의 하늘 아래,
사원과 빌딩이 나란히 서 있다.
그 풍경은 문명의 역사를 한 문장으로 요약한다 —
“인간은 신을 닮으려다 결국 인간으로 돌아왔다.”
돌로 쌓은 신의 왕국은 무너졌고,
이제 인간은 다시 흙 위에 자신의 도시를 세운다.
그것이 진화의 본질이다.
하지만 질문은 여전히 남는다.
우리는 앙코르의 돌을 보며 경이로움을 느끼지만,
그 돌이 세워질 때의 고통을 기억하지 않는다.
우리는 킬링필드의 사진을 보며 눈물을 흘리지만,
그 비극이 인간의 손으로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잊는다.
역사는 언제나 기억과 망각의 사이에서 반복된다.
그리고 그 반복이 바로 인간이다.
문명은 더 이상 신의 작품이 아니다.
그것은 인간의 거울이다.
앙코르의 돌과 킬링필드의 흙,
그 둘 사이에 서 있는 존재 —
그것이 오늘의 인간이다.
그 인간이 내일의 문명을 만든다.
그 문명은 어떤 형태일까?
아마도 여전히 불완전하고, 여전히 아름다울 것이다.
왜냐하면 불완전함이야말로
인간이 아직 인간임을 증명하는 마지막 징표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