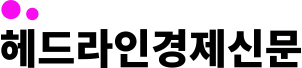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쌀 산업의 구조적 공급과잉 문제를 해결하고, 안정적인 쌀값 유지와 고품질 생산체계 전환을 목표로 한 ‘쌀 산업 구조개혁 대책(2025~2029년)’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구조적 공급과잉 해소 배경
쌀 소비량 감소와 생산 초과가 반복되며 시장격리를 통한 가격 안정에도 한계가 드러났다는 판단에 따라 이번 대책이 추진됐다. 국민 1인당 쌀 소비량은 2018년 61kg에서 2023년 56.4kg으로 감소 추세에 있다. 반면 생산은 여전히 무게 중심의 체계를 유지하고 있어 수급 불균형이 지속되고 있다.
농식품부는 시장격리에 의존하지 않고도 수급 안정이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벼 재배면적 감축과 품질 고급화 등을 포함한 5대 주요 과제를 추진한다.
5대 주요 과제
① 벼 재배면적 감축
벼 재배면적 8만㏊ 감축을 목표로 2025년부터 **‘벼 재배면적 조정제’**를 시행한다. 감축 면적은 시·도별로 배정하며, 농가는 타작물 재배와 친환경 전환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이를 이행한다. 감축을 이행한 농가에는 공공비축미 매입 등 정부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또한, 전략작물직불제를 확대해 타작물 전환 농가를 지원하며, 지급 단가를 인상(하계 조사료 430만→500만 원/㏊ 등)한다. 타작물 재배 기반 강화를 위해 배수개선 사업을 확대하고, 간척지 신규 임대 시 일반 벼 재배를 제한할 방침이다.
② 품질 고급화
고품질 중심의 생산·소비 구조로 전환한다. **고품질 쌀 전문 생산단지(50~100㏊)**를 지정해 시범 운영하며, 정부 보급종 공급체계를 소비자 선호 품종 중심으로 개편할 계획이다.
단수가 낮고 품질이 높은 친환경 벼 재배 면적을 2029년까지 68천㏊로 확대하며, 공공비축미 매입 시 우대 가격을 적용한다. 또한, 양곡표시제를 개편해 단백질 함량 표시를 의무화하고 쌀 등급 기준을 강화해 품질 관리 수준을 높인다.
③ 신규 수요 창출
쌀의 산업적 활용도를 높이고 소비를 확대한다. 식품기업이 민간 신곡 쌀을 활용할 경우 정책자금 우대 혜택을 제공하며, 수출·가공용 생산단지를 구축해 쌀가공식품과 전통주 산업의 수요를 늘린다.
아울러, 유망 시장인 싱가포르와 중국을 중심으로 쌀 수출을 확대하고, UN 세계식량계획(WFP)과 협력해 아프리카·아시아를 대상으로 식량 원조량을 늘릴 계획이다.
④ 산지유통 경쟁력 강화
고품질 쌀 유통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단일 품종 중심 유통 구조로 전환한다. 혼합미 비율을 2023년 42%에서 2029년 10%로 낮추고, 생산부터 유통까지 이력을 관리하는 생산이력제를 도입한다.
RPC(미곡종합처리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단순 도정 중심 구조에서 벗어나 제분·가공식품 생산 등으로 사업 다각화를 유도한다.
⑤ R&D 기반 확충
쌀 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생산기술 R&D를 추진한다. 적정 생산을 위한 비료 저감 기술과 논 재배에 적합한 타작물 품종 및 재배 기술을 개발한다. 또한, 장립종 등 외국인 수요가 높은 품종과 헬스케어 기능성 품종을 개발해 쌀 산업의 부가가치를 높인다.
농식품부 최명철 식량정책관은 “쌀 산업 구조개혁 대책은 관행적 생산체계를 소비자가 원하는 고품질·친환경 체계로 전환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수급 안정을 통해 쌀값 안정과 쌀 산업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대책의 차질 없는 추진으로 구조적 공급과잉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 가능한 쌀 산업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출처=농림축산식품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