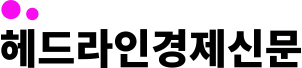“회사에 정은 없지만, 퇴사할 정성도 없다.”
요즘 직장인들 사이에서 자주 회자되는 이 문장은, 많은 MZ세대의 마음을 대변한다. 이들은 겉으로 보기엔 여전히 출근하고, 맡은 일을 처리하고, 월급을 받고 있지만, 마음 한켠은 이미 떠나버렸다. 이처럼 눈에 보이지 않게 조직에서 멀어지는 현상을 가리켜 ‘조용한 퇴사(Quiet Quitting)’라 부른다.
조용한 퇴사는 실제로 회사를 떠나는 것이 아니다. 그보다는 '회사가 기대하는 그 이상의 열정과 헌신'을 더 이상 주지 않겠다는 선언이다. 야근을 당연시하지 않고, 정시 퇴근을 원칙으로 삼고, 사적인 시간엔 일과 거리를 둔다. 슬랙이나 메신저 알림은 퇴근 후엔 꺼두고, 회식은 예의상 참석하지 않는다. 겉으론 조직에 충실해 보이지만, 실상은 '심리적 퇴사'에 가깝다.
이 같은 흐름을 기성세대는 종종 '무성의함'이나 '게으름'으로 간주한다. 하지만 MZ세대는 전혀 다른 시선을 갖고 있다. 이들은 오히려 ‘노동과 삶 사이의 건강한 거리두기’를 실천하는 중이다. 과거처럼 회사를 위해 헌신하고, 야근을 미덕으로 여기고, 상사의 말 한마디에 일희일비하던 시대는 지났다. 이들에게 ‘일’은 생계 수단일 뿐, 정체성의 전부는 아니다.
무조건적인 충성과 희생을 강요받으며 성장한 세대와 달리, MZ세대는 ‘나’라는 존재를 지키는 데에 더 큰 가치를 둔다. 내가 소진되지 않는 선에서, 내가 주도권을 쥔 채, 삶과 일을 조율하고자 한다. ‘열심히 일하면 언젠가는 보상받는다’는 신화는 이미 오래전에 깨졌고, ‘일에 미쳐야 성공한다’는 공식 역시 더는 유효하지 않다.
그래서 이들은 묻는다. 우리는 왜 일하는가?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서일까? 자아를 실현하기 위해서일까? 아니면 소속감이나 사회적 인정 때문일까? MZ세대는 이 모든 요소들을 이전 세대보다 훨씬 더 냉정하고 선명하게 구분한다. 조직은 더 이상 가족이 아니며, 출근은 헌신이 아닌 교환이다. 회사는 나를 대신 살아주지 않기 때문에, 나 역시 회사를 위해 나를 잃지 않겠다는 태도다.
이런 흐름은 시대가 바뀌었음을 분명히 말해준다. 조용한 퇴사는 단순한 트렌드가 아니라, 지금의 노동 환경에 대한 일종의 반작용이자 성찰이다. 일은 중요하지만, 삶의 중심이어선 안 된다는 자각. 인정받고 싶은 욕망보다, 스스로를 지키고 싶은 욕망이 더 커졌다는 선언. 이것이 바로 MZ세대가 조용히 보여주는 변화의 신호다.
우리는 이 변화 앞에서, 조용한 퇴사를 무책임하다고 몰아세우기보다, 왜 점점 더 많은 이들이 이렇게 떠나고 있는지를 물어야 한다. 그 안에는 오랜 시간 동안 억눌려왔던 피로감, 인간관계에 대한 허기, 삶에 대한 갈망이 담겨 있다.
일에 모든 것을 걸던 시대는 저물고 있다. 이제는 삶 안에 일의 자리를 적절히 배치하는 시대가 왔다.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이 세대는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