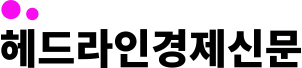서울의 한복판, 세운4구역이라 불리는 지역이 다시 논란의 중심에 섰다.
오래된 골목과 낡은 건물이 뒤섞인 그곳에, 서울시는 새로운 마천루를 세우겠다고 한다.
높이는 140미터 남짓, 바로 그 건너편에는 600년의 세월을 지켜온 종묘가 있다.
이곳은 단순한 재개발 구역이 아니다.
왕조의 제향이 이어졌던 유교문화의 상징이자,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공간이다.
그런데 최근 법원은 서울시의 손을 들어줬다.
종묘 인근의 높이 제한을 풀고, 고층건물을 세울 수 있다는 결론이었다.
결국 ‘보존’과 ‘개발’이라는 오랜 줄다리기가 또다시 도시의 한가운데에서 시작된 셈이다.
서울시는 말한다.
“이 지역은 오랫동안 정비가 지연돼왔고, 재개발을 통해 활력을 되찾아야 한다.”
한때 서울의 중심이었던 세운상가 일대는 산업과 인구가 빠져나가면서
도시의 공백처럼 남았다.
고층화는 새로운 인프라와 기업을 끌어들이는 유일한 해법이라고 주장한다.
더 이상 낡은 건물을 보존만 하며 시간을 멈춰둘 수 없다는 논리다.
하지만 문화재 보호 단체의 시선은 다르다.
그들은 종묘의 가치를 ‘공간의 완전성’에서 본다.
단순히 건물 하나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주변의 하늘, 경관, 공기까지 함께 지켜야 한다고 말한다.
높은 빌딩이 종묘의 뒤편에 세워지는 순간,
600년의 시간은 유리벽에 갇히고, 조상의 제례 공간은 그림자로 덮일 수 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한편으로 지자체의 재량권을 인정한 결정이었다.
법적으로 종묘의 보존지역은 ‘100미터 이내’로 한정돼 있고,
세운4구역은 그 바깥에 속한다는 점에서 서울시는 규제를 피해갔다.
그러나 문제는 법의 경계가 아니라, 도시가 가진 ‘정서의 경계’다.
눈앞의 숫자로는 계산되지 않는 문화의 무게가 있기 때문이다.
도시는 성장해야 한다.
그러나 그 성장은 오래된 역사와 기억을 무너뜨려서는 안 된다.
서울이 진정으로 세계적인 도시로 나아가려면
‘유산을 보존하면서 발전하는 기술’을 익혀야 한다.
그것이 도시계획의 성숙이고, 문화도시의 품격이다.
지금 종묘 앞에서 벌어지는 논쟁은 서울의 미래를 비추는 거울과도 같다.
우리는 여전히 “얼마나 높이 올라갈 수 있을까”를 묻고 있지만,
이제는 “얼마나 오래 남길 수 있을까”를 함께 물어야 한다.
도시의 가치는 빌딩의 높이가 아니라,
시간이 머무는 풍경을 얼마나 존중하느냐로 결정된다.
개발이든 보존이든 어느 한쪽이 완전히 옳을 수는 없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한 나라의 역사는 언제나 ‘가장 오래된 공간’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이다.
종묘의 고요한 담장 옆에서 솟아오를 빌딩들이 그 진실을 존중해 주기를 바란다.
※면책사항: 이 칼럼은 특정 기관이나 프로젝트의 이해관계와 무관한 중립적 의견으로, 투자나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