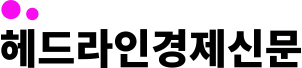요즘 대학가에서는 조용한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인공지능이 ‘도움’의 이름으로 학생들의 시험장에 들어오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스마트폰의 화면 속에는 이미 모든 정답이 준비되어 있고, 에세이 과제의 문장은 AI가 매끈하게 다듬어준다. 누가 대신 써준 것도 아니고, 눈앞에 사람도 없지만, 결과적으로는 부정행위다. 더 이상 커닝페이퍼를 몰래 꺼내는 시대가 아니라, 프로그램이 대신 손을 움직여주는 시대가 된 것이다.

AI가 등장하면서 교육의 의미는 근본부터 흔들리고 있다. 예전에는 ‘배움’이란 자신이 이해하고 표현하는 과정이었지만, 지금은 ‘정답을 얼마나 빠르게 찾아내는가’의 문제가 되어버렸다. 학생들은 AI를 ‘도구’로 사용한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도구가 사용자를 이끌고 있다. 한 번이라도 편리함을 맛본 사람은 다시는 원래의 불편함으로 돌아가기 어렵다. 그렇게 해서 남는 것은 지식이 아니라, ‘검색의 기술’이다.
교사들은 요즘 시험지를 낼 때마다 고민이 깊다. 단답형 문제는 AI가 순식간에 풀어버리고, 서술형 문제는 글의 구조까지 모방해낸다. 감정과 어조, 문체마저 인간처럼 흉내내니, 누가 직접 쓴 것인지 구별하기 어렵다. 결국 채점은 기술적 탐지에 의존하게 되고, 시험의 본질은 ‘AI가 쓴 글을 잡아내는 일’로 바뀌고 있다. 이 얼마나 역설적인가.
학생들에게 “AI를 쓰면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은 이제 ‘인터넷을 쓰지 말라’는 말만큼 비현실적이다. 이미 그들은 태어날 때부터 AI와 함께 성장한 세대다. 문제는 금지의 영역이 아니라 ‘윤리의 경계’를 새로 그리는 일이다. 아무리 똑똑한 인공지능이라도, 그것이 대신 살아주는 인생은 없다. 대학이 가르쳐야 할 것은 더 이상 ‘지식의 총량’이 아니라 ‘도구를 어떻게 다루는가’의 문제다.
그러나 현실은 다르다. AI를 막기 위해 학교는 탐지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학생들은 그것을 우회하는 새로운 기술을 찾아낸다. 그 싸움은 끝이 없다. 누군가는 코드 몇 줄로 ‘AI 탐지 우회’를 팔고, 누군가는 ‘AI 글처럼 보이지 않는 방법’을 강의한다. 부정행위의 패턴이 디지털화되면서, 이제는 양심조차 알고리즘처럼 계산된다. “이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라는 자기 합리화가 반복되며, 사람들은 점점 죄책감의 감도를 잃어간다.
시험 부정행위는 단순히 점수의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신뢰의 붕괴’와 맞닿아 있다. 누군가가 AI로 과제를 완성하고 좋은 성적을 받는 순간, 옆의 학생은 노력의 의미를 잃는다. 성적은 더 이상 노력의 증거가 아니라, 기술의 결과로 읽힌다. 그렇게 신뢰가 무너진 사회에서는 평가 시스템 전체가 흔들린다. 결국 성적표에 적힌 숫자는 더 이상 인간의 성취를 증명하지 못한다.
AI는 분명 인간을 돕기 위해 만들어졌다. 하지만 도움과 대체의 경계는 생각보다 얇다. 과제를 쓰는 학생이 단지 문장 정리를 맡겼다고 생각하더라도, 그것은 이미 창작의 일부를 넘긴 셈이다. 처음엔 ‘도움’이었지만, 나중에는 ‘대리’가 된다. 이 작은 타협이 반복되면, 결국 스스로 생각하는 능력은 퇴화한다. 마치 자전거 보조바퀴를 너무 오래 단 채로 자란 아이가 그 바퀴 없이는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는 것처럼 말이다.
그렇다면 해답은 어디에 있을까. 금지보다 더 강력한 것은 ‘책임의 자각’이다. 인공지능을 사용하는 데 윤리가 필요하다는 말은 거창한 선언이 아니다. 그저 ‘내가 한 일에 책임질 수 있는가’라는 단순한 물음이다. AI가 대신 써준 문장을 제출한다면, 그것은 나의 생각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결국 인간의 존엄은 ‘스스로 생각하는 능력’에서 비롯된다. 그 능력을 타인이나 기계에게 맡기는 순간, 배움은 껍데기만 남는다.
시험은 인간이 만든 가장 오래된 ‘정직의 실험’이다. 아무도 보지 않는 자리에서 얼마나 스스로에게 솔직할 수 있는가를 시험하는 의식이다. 그 시험이 무너질 때, 교육은 신뢰를 잃는다. 그리고 신뢰를 잃은 사회는 방향을 잃은 나침반과 같다. AI가 더 발전하고 더 정교해질수록, 우리는 ‘정답을 아는 것’보다 ‘정답을 스스로 찾는 과정’을 지키는 쪽으로 나아가야 한다.
기술은 언제나 인간의 거울이다. AI가 부정행위의 도구로 쓰인다면, 그건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선택의 문제다. 우리가 만들어낸 인공지능이 결국 우리를 시험하고 있다. 그 시험은 단순한 학교 시험이 아니다. 그것은 ‘인간이 얼마나 인간일 수 있는가’에 대한 시대의 질문이다.
결국 AI 시대의 진짜 부정은 ‘정답을 훔치는 것’이 아니라, ‘배움의 의미를 포기하는 것’이다. 이제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다. AI가 대신 써준 문장을 제출하면서, 정말로 자신을 증명했다고 말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그 정답이 아무리 완벽하더라도, 그 속에 당신의 생각이 없었다면, 그것은 과연 누구의 지식일까.
시험은 변할 것이다. 교육도, 평가도 바뀔 것이다. 그러나 변하지 말아야 할 것은 단 하나다. 스스로 배우고, 스스로 생각하며, 그 결과를 자기 이름으로 세상 앞에 내놓는 일. 그 정직함이 사라진다면, 인공지능이 아니라 인간이 시험에서 낙제하게 될 것이다.